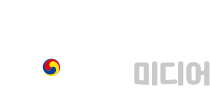간도는 누구의 땅인가? - 정계비(하) | 간도 분쟁의 빌미를 준 "토문"은 두만강이 아니라 만주로 뻗은 송화강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참한역사미디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3-06-01 00:28본문
[윤명철교수의 역사대학]
간도는 누구의 땅인가? - 정계비(하) | 간도 분쟁의 빌미를 준 "토문"은 두만강이 아니라 만주로 뻗은 송화강이다.
강희제는 두 강 이북에서 조선인들과 여진인, 한인들이 충돌하는 상황을 빌미로 백두산 일대를 측량하고, 경계선을 확정시키는 2차 작업에 착수했다. 드디어 1712년 3월에 강희제의 명을 받은 오라(길림) 총관인 목극동은 조선 관원들의 참여를 막은 채로 백두산의 대택(천지)에 올라갔다.
내려온 그는 주위를 유심히 관찰한 후에 천지(대택)의 동남쪽 4km 지점(해발 2,150m)을 지정한 후에 높이 70,6cm, 폭 54.6cm의 돌비를 세우고, 82글자를 새겨 넣었다. 이 비는 1929년(1931년 7월 설)에 사라지고, 현재는 주변에 표지석인 돌무더기만 일부 남아있다(이한기, "한국의 영토"). 그런데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는 글로 인하여 다양한 해석과 주장들이 생겼다. 19세기 후반부터 간도 분쟁을 거쳐 최근에는 간도 영유권 문제로 비화된 상태이다. 비록 논쟁의 여지가 몇가지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로서는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土門(강)과 豆滿(강), 圖們은 위치, 지형, 물길, 발음 등이 분명히 다르다. 목극등(穆克登)은 지형을 설명하면서 토문(강)의 물이 끊어진 곳(건천)을 조선에서 표시해 줄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두만강 선을 고수한다는 조선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박권은 두만강이 그 곳이 아니라며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목극등은 ‘토문’이 분명하다며 설명까지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목극등의 판단에 실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청나라는 레지가 정확하게 측량한 후에 조선의 지도까지 참고해 만든 만주지도가 이미 있었다(1709년 12월 완성). 그렇다면 황제의 명을 받고(奉旨) 국가사업을 실행하는 목극등이 이 지도를 참조했거나 소지했음은 분명하다. 더구나 그는 1차 답사에서 토문강이 송화강과 합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었다. 따라서 그의 목적은 천지(대택)를 포함한 장백산(백두산)을 청나라의 영토 또는 관할권으로 만드는 일이었다. 조선은 이 때 백두산과 대택(천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청나라에 넘기고 말았으며, 다음 해(1713년) 9월에 중단될 때까지 토문강 상류의 건천(끊어진) 부분에 185개의 흙무더기와 돌무더기를 쌓고 목책을 설치했다(육락현, "간도는 왜 우리땅인가?")
또 하나 밝혀야 할 사실이 있다. 만약에 ‘토문’이 ‘두만’이라면 두만강 이북은 청나라 영토이어야 한다. 그런데 레지가 측량하고 조선의 지도를 참고하여 만든 J. J. B. 당빌의 "새중국지도("Nouvel Atlas de la China)"와 1718년에 완성된 "황여전람도(黃輿全覽圖)"에는 조청의 경계선이 더 북쪽에 그려져 있다. 당빌의 지도를 보면 두만강 하구의 약 6km 동쪽 지점에서 시작해서 ~ 백두산을 가로질러 압록강 상류의 모든 수계를 포함하는 동서산맥에 선을 긋고, ~ 봉황성의 남쪽을 압록강 하구의 대동만에 이르는 지역에 국경선이 그어져 있다. 이는 듀 알드(J.B.Du Halde)의 "중국지(Description de Chine)"에서도 동일하다. 당빌은 "새중국지도(Nouvel Atlas de la China)"의 서문에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은 거의 정확하고 완전함을 강조했다(김득황, "백두산과 북방경계").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레지가 측량했을 때, 목극등이 비를 세웠을 때, 강희제가 승인해서 서양까지 알려진 "황여전람도"가 반포됐을 때에는 조선의 영토를 두 강의 이북까지 인식했을 개연성이 크다. 물론 지도를 제공한 조선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이를 입증하는 지도와 글들이 많다. 반면에 토문을 두만강으로 인식한 다른 견해들이 있으므로 논쟁은 계속 중이다. 하지만 "연행록"들을 비롯하여 다른 자료들의 비중을 고려하고, 실제 사건들과 향후 전개된 역사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두 강은 국경선이 아니라 청나라의 무력과 조선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설정된 봉금지대의 남쪽일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무인지대로서 지금의 ‘휴전선(DMZ)’과 동일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더불어 정계비에 새겨진 ‘압록’과 ‘토문’은 본류 만이 아니 수계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빌이 만든 "새중국지도" 등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앞으로 정계비 문제는 압록강 이북의 조선영토 및 국경선과 더불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정계비를 자국 중심으로 해석하고, 심지어는 비의 위치가 4번이나 이동됐다는 주장까지 한다. 러시아의 영토 전문학자인 갈레노비치는 이렇게 말했다. “마오쩌둥과 그의 추종자들은 ‘지도를 통한 공격’을 했다.” 중국인들은 지도를 왜곡하거나 유리하게 만들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지도를 제시하면서 자기주장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방식을 쓴다는 것이다(윤명철, "동아시아의 해양영토분쟁과 역사갈등의 연구").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