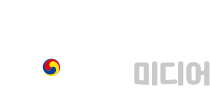유라시아를 오고 간 우리 계열 문화들| 알타이 문화권과 우리 역사. 2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참한역사미디어 댓글 0건 조회 262회 작성일 24-06-02 02:39본문
[윤명철교수의 역사대학] 유라시아를 오고 간 우리 계열 문화들| 알타이 문화권과 우리 역사. 2부
윤명철교수는 한민족 역사의 흔적을 찾아 유라시아, 중앙아시아의 자연, 유적, 유물, 산업, 사람들을 수없이 조사 답사하고 만나고 얘기한다.
중앙아시아 세계 역사문화를 연구하는 관점과 방법론의 제안 -1
윤명철 (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우즈베키스탄 국립사마르칸드 대학교 고고학)
목차
1 서론
2. 중앙아시아 세계의 생태환경—공간의 문제
3. 중앙아시아 세계의 주민과 나라들- 주체의 문제
4. 중앙아시아 세계의 문화와 예술-의미의 문제
5. 중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가치의 문제
6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 정의한 유라시아 세계는 아시아 세계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연동된 공간이다. 그 유라시아 세계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지형적 위치에 중앙아시아가 있다. 그 광대한 공간 속에는 다양한 생태환경들이 존속하고, 다양한 주민들이 오고 갔으며, 수많은 나라들이 명멸했다. 그 과정과 결과로서 새로운 역사와 문화가 배양되고, 배급되는 공간의 역할을 한 ‘문명권’이었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세계의 실상을 이해하려면 다양성과 복합성을 낳게한 배경과 구성요소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과정과 결과들을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제 2장에서는 생태환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몇 개로 범주화시키고, 이와 연관된 ‘교통망’의 실체를 새로운 관점으로 유형화시켰다. 유라시아 세계는 7개의 공간으로 범주화시켰고, 중앙아시아는 3개 공간으로 범주화시켰다. 그리고 다양한 조건들을 분석하여 유라시아 공간은 6개의 동서횡단망과 3개+&의 남북 종단망으로 유형화시켰다. 바년에 중앙아시아는 3개의 공간으로 범주화시키고, 이것을 분석하여 2개의 동서횡단망과 몇 개의 남북종단망으로 유형화시켰다. 제 3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세계에서 살았던 다양한 주민들의 복잡한 생성과정과 성격, 역할들을 형질 및 언어, 역사과정을 매개로 분류하여 파악했다. 이어 그 결과들을 토대로 몇 개의 중요한 지역에서 건국하고, 발전하고, 멸망한 수많은 정치체(나라)들을 소개하고, 의미도 서술하였다. 제 4장에서는 인류 문명에서 의미가 깊었던 문화와 예술의 생성과 변형과정을 생태 및 역사와 연관시켜 파악했다. 특히 고분문화, 암각화, 기마문화, 건축문화 등의 중요한 지표유물을 질료로 삼아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간환경에 따라 초원유목문화, 삼림수렵문화, 건조농경문화, 사막상업문화 등이 발달했으며, 환경에 적응한 독특한 문화가 있음을 살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의 ‘내적논리’를 분석해서 중앙아시아 세계의 신앙과 철학의 종류와 성격 등을 이해했다. 제 5장은 중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 즉 중앙아시아 세계가 인류에게, 그리고 한민족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모색했다.
‘가치’의 문제는 연구의 주제라는 시각, 연구 소재의 선택, 방법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정학(Geo-pollitic)적 가치와 지경학(Geo-economic)적 가치, 지문화적(Geo-culture) 가치로 유형화시켜 분석하였으며, 인류문명의 미래와도 연관시켜 살펴보았다.
1. 서론
인류역사의 발전과 동양과 서양의 교류 과정, 한민족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유라시아 세계에 대한 이해는 필요한 작업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장대한 대륙이고, 동서의 길이가 9000km 이상되고, 남북의 길이 또한 4000~5000km에 달한다. 당연히 자연환경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생태환경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과 복합성을 가진 공간에서 인류의 중요한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유라시아 세계, 특히 그 세계의 중간인 중앙아시아 세계를 이해하려면 대단위, 문명권 등 또 다른 관점과 방법론 등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이며, 전체(whole)라는 거시적이고 범공간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주로 근대 이후에 서양 연구가들은 특정한 ‘점(place, land, region)’을 선택한 후에 조사하고, 연구한 후에 그 결과들을 ‘지표(index)’로 삼아 전체로 확장시키는 방법을 활용했다. 때문에 거시적인 것 같지만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것 같지만 추상적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연구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정치경제적,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강대국들이 일방적으로 기록하고 평가한 내용의 상당한 부분들은 아직도 통용되고 있다. 사실은 근대 이후에 알아낸 문화의 증거들인 유물, 유적, 문헌 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채 활용못하고 있다. 더욱이 중앙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자신들의 관점과 자료로서 연구하는 데는 경제적, 사회적, 학문적인 한계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 큰 틀에서 몇 가지 관점과 연구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역사와 문명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에서 핵심인 ‘공간’ ‘주체’ ‘문화’ 등을 통해서 유라시아 및 중앙아시아 세계를 연구하는 관점과 연구방식을 제언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첫째는 중앙아시아의 생태환경을 분석하면서 역사문화적인 공간들을 유형화시킨다. 둘째는 그 생태환경을 근거로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복잡한 역사를 낳게한 교류의 길을 살펴본다. 즉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망을 찾고, 이어 본고의 주제인 중앙아시아와 연결된 교통망을 살펴본다. 셋째는 주체의 문제로서 중앙아시아 세계에서 장기간 거주했거나 거쳐 간 종족들과 그들이 세운 나라들을 살펴본다.
넷째는 문화의 문제로서 이 공간의 문화를 다양한 관점, ‘문명권’이라는 범공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문화가 우리문화와 어떠한 연동성이 있는가도 살펴본다. 특히 역사상의 문화적인 단절과 왜곡현상이 있었던 한민족의 문화, 주민, 역사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중앙아시아의 현재 위상과 가치를 살펴본다. 필자는 ‘역사학은 미래학’이라는 명제를 일찍부터 발표했고, 역사상을 이해하는 전제로서 활용했다. 중앙아시아 공간은 역사 이래, 특히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세계질서의 변동과 연동되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으며, 그 것이 이 공간의 연구에 영향을 끼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정치, 경제적인 상황과 연동성에 따라서 연구경향과 방식, 주제와 소재에도 작동하므로 기본배경과 미래의 전략적 가치를 살펴보는 일도 하나의 연구관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연구방법론의 제언이라는 글의 성격상 분석, 검증, 상호비교 등의 논문형식을 벗어났음도 밝힌다.
2. 유라시아 생태환경(ecological environment)의 이해—공간(field)의 문제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