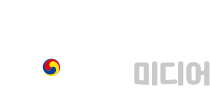광개토태왕비 1 부 | '천손'이라는 가계와 '다물'이라는 발전 목표를 선언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참한역사미디어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3-06-09 00:10본문
[윤명철교수의 역사대학] 광개토태왕비 1 부
'천손'이라는 가계와 '다물'이라는 발전 목표를 선언하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성리학자들은 조선을 칭송할 목적으로 지은 ‘龍飛御天歌’와 고려사에서 이성계가 이 지역을 평정했으며, 황성이 있었음을 기록했다. 그런데 황성은 금나라의 수도이며, 광개토태왕비를 ‘금나라 황제비’라고 보았다. 조선 후기의 이수광 또한 지봉류설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1877년에 關月山이라는 중국인이 이 비를 발견했고, 1882년에 ‘사까와’라는 한 첩보군인이 들어와 임시탁본을 떠서 일본으로 갖고 귀국하였다. 일본 참모본부는 몇 년 동안 비밀연구 후인 1889년 광개토태왕비라고 공표하였다. 비는 네 면을 돌아가며 1775자 이상의 글자가 예서체에 가까운 고구려 특유의 웅혼하면서도 정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필체이다.
이 긴 문장은 크게 3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선 첫 부분은 고구려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건국자인 추모(주몽)가 누구의 피를 이었으며, 어떻게해서 나라를 세웠는지. 비의 주인공인 대왕은 누구의 혈통을 이었으며 추모의 몇 세 손인지? 등이다. 고구려의 정체성을 표현하면서 비를 건립한 과정 등을 신비하고 열정적인 문투로 서술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본문에 해당된다. 이 비는 기본적으로 태왕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 또는 공적을 새겨놓은 훈적비이기도 하다. 따라서 태왕이 임금자리에 있었던 22년 동안 활동한 내용과 정복한 영토, 그리고 태왕으로서 자기의 세계를 巡狩한 일 등을 연대순으로 기록하였다. 거기에는 ''삼국사기'가 놓쳐버리거나, 혹은 고의로 빼버린 고구려의 역사와 고구려 사람들의 삶이 굵은 글자의 명암으로 알려준다. 마지막 부분은 이 비와 성웅의 능을 지키는 사람들, 즉 수묘인이 누구이고 어디 출신이며,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
무심한 역사, 망각의 역사 속에 이미 1500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탓에 비문은 적지않이 훼손됐고, 글자상태 또한 손질을 한 지금조차도 좋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을 정도였다. 석재가 무른데다가 표면과 사면의 선이 울퉁불퉁하고, 돌색도 어두침침할 정도로 진하기 때문에 글자를 분별하기가 힘들다. 거기다가 오랫동안 버려진 탓에 흙과 풀, 이끼들로 표면이 어지러웠다. 또한 연구자료는 사까와가 떠온 탁본은 대충으로 하는 임시요법인 ‘쌍구가묵본’이었으므로 비문을 조작하거나 왜곡시키기에 적당했다. 비밀연구 끝에 발표한 결과물은 일본군대가 했다. 의심을 받을만 했고, 비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한 일 중 일 간에는 숱한 역사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 시키고, 또 공고화하기 위해서 이 비를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논쟁이 심한 내용은 1면의 왼쪽 중간 아래부분인 소위 신묘년 조항이다.
‘--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新羅以爲臣民以六年丙申王躬率水(?)軍討伐殘國軍---’
이 문장을 일본인들은 ‘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속민이었다. 왜가 신묘년 이래 바다를 건너와 백제 임나가라 신라를 공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을 하였다. 즉 문장을 ‘而倭以辛卯年 來渡海破 百殘??新羅 以爲臣民以’라고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그 무렵에 전개된 동아시아의 역학관계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설득력이 별로 없다. 그 무렵에 일본은 그들의 희망사항과는 달리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거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지역조차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나라들의 집합체였다. 한편 조선의 뛰어난 한학자인 정인보선생은 ‘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 (고구려)渡海破百殘? ? ? 羅 以爲臣民--’ 라고 해석하였다. 그렇게 되면 바다를 건넌 주체 또한 고구려가 된다. 우리에게는 유리한 해석이다. 이후에 북한과 남한의 일부에서는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도 대체로 이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종류의 탁본들이 공개되었고, 해석들도 다양해졌다. 이진희씨는 몇 개의 귀절을 왜곡하거나 글자를 위조했다는 주장을 하였다. 소위 ‘임나일본부설’은 이 비문의 신묘년 조항의 해석과 관련깊다. 하지만 이 비는 무미건조하게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대왕을 찬양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라고 단정짓기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
우선 왜 비를 세웠는가? 무슨 목적으로 세웠으며, 이 비를 통해서 알리고자 한 내용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일이 순리에 맞고, 이것이 장수왕과 고구려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길이다.
광개토태왕릉비는 5세기를 열고 고구려 중심의 신질서를 개화시킨 광개토태왕의 정책을 계승하고, 이를 완결시킨 장수왕이 초년에 세운 상징물이다. 단순한 돌덩이나 혹은 기념비가 아니며, 더더욱 개인의 묘비만이 아니다. 그 무렵에는 이미 많이 새로워진, 또는 새로워질 고구려 자체를 반영하는 상징물이다. 고구려의 역사, 고구려 사람들의 정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후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광개토태왕의 업적뿐만 아니라 그를 평가하고, 성공했다는 선언과 다음시대의 계승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부자, 즉 두 지도자의 역사관과 세계관 등이 응축되었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 비록 구체적으로 정책의 목표들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세계관, 정치관, 문화관 같은 핵심적인 사항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윤명철 지음 '고구려 역사에서 미래로'. '말타고 고구려 가다'. '고구려는 우리의 미래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